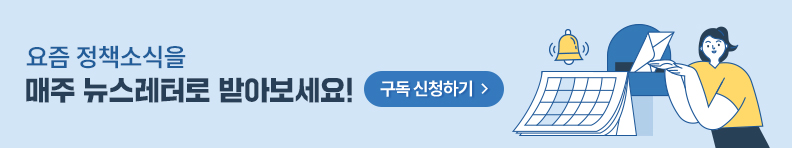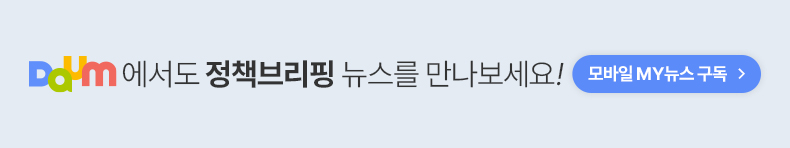콘텐츠 영역
‘녹청자’처럼 푸근한 맛, 인천 ‘닭알탕’

TV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성작가라는 직업은 매번 새롭거나 재밌는 아이템을 찾아 시청률을 올리는 ‘귀신같은 감각’이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구성을 잘하거나 자막을 잘 뽑고 원고를 잘 써도 화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장되기 일쑤여서, 작가들은 늘 화끈한(?) 아이템에 목이 마르다. 벌써 수년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담당하면서 전국을 두세 바퀴 돈 터라 ‘로컬’이라면, 어느 정도 잔뼈 정도는 섰다고 자부했는데, ‘100가지 지역문화 - 로컬100’ 리스트를 면면이 확인하고는 아뿔싸! 생각을 바로 고쳐먹었다.
‘로컬100’에서 가장 먼저 내 눈에 띈 건 인천의 ‘녹청자박물관’이었다.
KBS의 장수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터라 해남, 강진, 부안, 용인 정도로 청자 가마터를 알고 있던 나로서는 인천에 녹청자박물관이 있다니, 바로 호기심이 일었다. 늘 색다른 아이템을 갈구하는 내 촉이 제대로 발휘했다. ‘그래, 녹청자박물관에 가 보자!’
예부터 청자를 가리켜 ‘고려를 보는 창(窓)’이라고 했다.
중국에도 청자가 있었건만 남송대 문헌에도 ‘고려비색 천하제일(高麗秘色 天下第一)’라며 고려청자의 은은한 푸른 빛 비색을 칭송했다. 허나 녹청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천 년 전 최고의 공예품이자 최고의 하이테크 고려청자가 고급문화 향유층의 전유물이었다면, 녹청자(綠靑瓷)는 서민들의 일생 생활 도자기로 대접, 접시, 찻잔 같은 그릇이 대부분이다. 관상용이 아니라 철저히 기능성을 추구한 것들이다. 차마 비색이 못 되고 그저 그런 녹색으로 태어난 팔자, 그렇게 이름이 됐다.

나 역시 백반집의 빛바랜 간판, 노포의 낡은 탁자, 찌그러진 주전자, 오래된 쓸모 있는 것들을 애정하는 지라 비색 아닌 녹청자의 2% 모자란 결핍의 빛깔을 충분히 사랑한다. 그 녹청자를 씻고 닦고 거기에 밥을 담고 국을 담았을 내 어머니의 어머니들을 그려보자면 가만히 애잔해진다.

녹청자박물관은 2층의 아담한 박물관 외관은 청록색으로 마감한 데다 가운데 도자기 형태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누가 봐도 녹청자박물관답다. 이곳의 녹청자는 타 지역에서 발굴된 녹청자보다도 유약이 엉성했던지 갈색에 가까운 갈녹색조를 띠고 태토도 거칠었다.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겹겹이 빼곡하게 구운 흔적도 여실했다. 접시나 완의 가운데를 보면, 그 위에 쌓아 올린 그릇의 발 흔적이 또렷이 남은 것이다. 아, 먹고 사는 일이 요원하던 시절- 대체 이 그릇 하나는 대체 얼마나 귀했을꼬.
생각해 보라, 도자기를 굽기 위해 가마에 불을 한 번 떼자면 1200도 이상의 센 화력을 최소 24시간 이상 필요로 했다. 장장 1톤이 넘는 고급 장작을 때야 하는데, 지금처럼 땔감이 흔하던 시절도 아니었을 터- 한 번 가마를 태울 때 한 개라도 더 많은 그릇과 접시를 구워야 했으리라.
화기를 올리기 위해 비스듬히 제작한 가마에 가마 아래쪽에서 쉴 새 없이 땔감을 때는 동안 가마 안의 그릇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릇 하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겹겹이 쌓아 올린 그릇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을 터, 도공들은 나름의 노하우로 안정감 있게 그릇을 배치하면서도 나름의 미학적 성취를 위해 기하학적 문양을 그려 넣기도 했다. 그만큼 그릇 하나가 귀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도자기 감정으로 유명한 이상문 교수는 드라마에서 도자기 장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를 깨부수는 장면을 극도로 싫어했다. “쓸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깨진 파편도 접시로 쓰는 판국에 도자기를 깬다는 게 가당키나 해?”
(0).jpg)
이미 미추홀 때부터 인천 일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실생활에 쓰는 그릇 수요도 많았으리라. 도공들은 그릇 만들어내기 바빴을 것이다. 이 녹청자들은 집집 가난한 백성들의 집으로 팔려 가 이름 없는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요긴한 벗이 될 터였다. 푸성귀에 거친 밥, 맹한 국이었을지 모를, 어느 가족과 생을 함께할 운명이었다.
쇳빛에 가까운 갈색녹조의 거칠고 투박한 인천 경서동의 녹청자는 그래서 더욱 친근하고 푸근하다. 겹겹이 쌓은 접시들의 작은 편린(파편)조차도 고마운 일이다.
짧게나마 한때는 백제의 수도였고, 또 한때는 경성과 맞닿은 항구 도시 인천은 근대화의 상징이자 개항의 상징이었다. 건국 이래 인천은 늘 부산과 자웅을 겨루는 대도시였다. 하지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각인된 부산은 제2의 수도니, 동백섬이니 해운대니 하는 휴가와 멋과 낭만의 도시로 변모했다. 인천은 좀 다르다.
일제가 지은 공장은 물론, 정미소, 성냥 공장이 즐비했고 광복 후에는 동일방직, 일진전기,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인천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됐다. 경공업부터 중화학 공업에 이르기까지, 인천항은 전국에서 몰려온 노동자들로 북적였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끈 제조업의 전초기지 인천. 죽도록 일했던 산업 역군들은 늘 배가 고팠고 술이 고팠다. 늘 곱빼기로 말아 먹는 노동자를 위한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도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1978년, 잘나가는 현대가 인천제철을 인수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노동자들이 많이 찾던 인천 동구의 시장은 이름을 아예 인천 현대시장으로 바꿨다.
그 현대시장 건너편에 노동자들이 사랑한, 노동자들의 음식 ‘닭알탕’이 아직 남아있다.
병어회, 닭똥집, 꼼장어(‘곰장어’가 표준어지만 꼼장어라 쓰겠다), 닭발, 간과 천엽 등 족보 없이 갖은 안주 일체를 팔면서 ‘닭알탕’으로 화룡점정을 찍은 노포들이 여전히 그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jpg)
우리말 ‘닭’과 한자어 ‘알탕’이 오묘하게 섞인 닭알탕은 닭이 알을 낳기 전, 즉 세상의 빛을 보기 전 닭의 뱃속에 있는 ‘노른자’와 그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알집’을 탕으로 끓인 것이다. 난생처음 접한 ‘닭알’을 설명하려 하니 장황하기 짝이 없다. 아마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친숙한 이름과 친숙한 비주얼에 눈이 가는 법이니까.
결국 달걀이 못 된, 여린 ‘닭알’과 곱창인 듯 막창인 듯 애매하게 생긴 ‘알집’이 잔뜩 들어간 닭알탕은 들큼한 양념장과 깻잎, 들가루가 더해지면서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배가 된다.
일 원짜리 동전 크기부터 오백 원짜리 동전까지 크기가 다다른 샛노란 ‘닭알’은 달걀노른자보다 훨씬 쫀득쫀득하면서 탱글탱글하다. 알집은 곱창보다 씹는 맛이 있으면서도 담백하다. 국물은 곱창전골 같기도 하고 감자탕 같기도 하고, 적당히 고깃국물 같으면서도 달걀 특유의 미끈한 냄새 하나 없이 구수하다.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유례없이 햄도 끓여 먹는 ‘부대찌개’를 낳은 유별난 민족이지만 어떻게 닭알을 음식으로 요리할 생각을 했을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라면 닭 한 마리도 귀했던 시절이죠. 현대시장 닭집이나 가판대에선 닭만 팔리니까 닭알과 알집을 따로 팔았습니다. 그냥 버릴 요량인데 이거라도 끓여서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포장마차의 할머니 한 분이 그걸 사다가 탕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몰리자 한 집 두 집 닭알탕을 메뉴로 들여놓아 푸짐하게 팔았죠. 퇴근길에 이 닭알탕 하나로 소주를 몇 병이나 마시는지 몰라요.”
35년 전 가게를 인수한 ‘현대원조닭알탕’의 양근주 사장(72) 역시, 전라북도 진안이 고향이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와 안 해 본 것이 없이 고생했다며 국물 좀 더 달라는 사람, 밥 더 달라는 손님들의 청을 거절해 본 적 없단다. 전부 오라비이자 동생이자 누이이자 피붙이처럼 정겹던 사람들. 하루 종일 기름때와 씨름하면서도 늘 가난했던 노동자들, 고향으로 다달이 부치는 돈이 버거웠고 타향살이 사글세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없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주머니 헐거워도 닭알탕 덕분에 거나하게 소주 한잔 걸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리 푸짐한 소(小)짜에 이만 오천 원, 여기에 쫄면 사리 넣어서 국물 자작하게 졸여 먹고, 마지막에는 볶음밥까지 볶아 먹는 게 닭알탕을 제대로 즐기는 순서다. 소주를 곁들이면 더 좋다.
.jpg)
청춘을 이 닭알탕과 보낸 양 사장님은 여전히 육수 하나 없이 맹물에 오로지 들깨와 깻잎, 파, 이렇게 세 가지 재료로 닭 특유의 잡내를 잡기에 매일 건너 현대시장에서 장을 본다. 들깨가 암만 맛있대도 과하면 맛을 해친다며 닭알의 크기를 봐 가며 조절한다.
아닌 게 아니라 단출한 김치와 깍두기도 양념이 과하지 않아 닭알탕과 더없이 잘 어울린다.
시절이 바뀌어 현대시장 닭 파는 가게는 사라졌고, 문지방 닳듯 드나들던 먹성 좋은 총각들은 흰머리 숭숭한 노인이 되었지만 이 골목의 진하디 진한 냄새는 여전하다.
일주일에 한 번 하림에서 들여오는 닭알과 알집이 50kg. 그만큼 팔린다는 소리고 여전히 이곳 닭알탕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다. 가장 서민적이면서 가장 생활적인 이 맛! 누구나 한번 맛보면 닭알탕의 녹진한 국물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오늘 밤, 녹청자 사발에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꿈을 꾸겠다. 물론 안주는 닭알탕이다.

◆ 이윤희 방송작가, 로컬문화 전문가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 ‘한식연대기’, 넷플릭스 ‘삼겹살 랩소디’, 스카이트래블 ‘한식기행 - 종부의 손맛’ 등 우리 식문화를 소재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방송작가 22년 차지만 언제나 현역~! 지역마다 고유한 맛과 멋을 알리는 맛깔 난 글을 쓰고 싶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